- By 김예닮
- 2025-08-29
- 73
- 0
- 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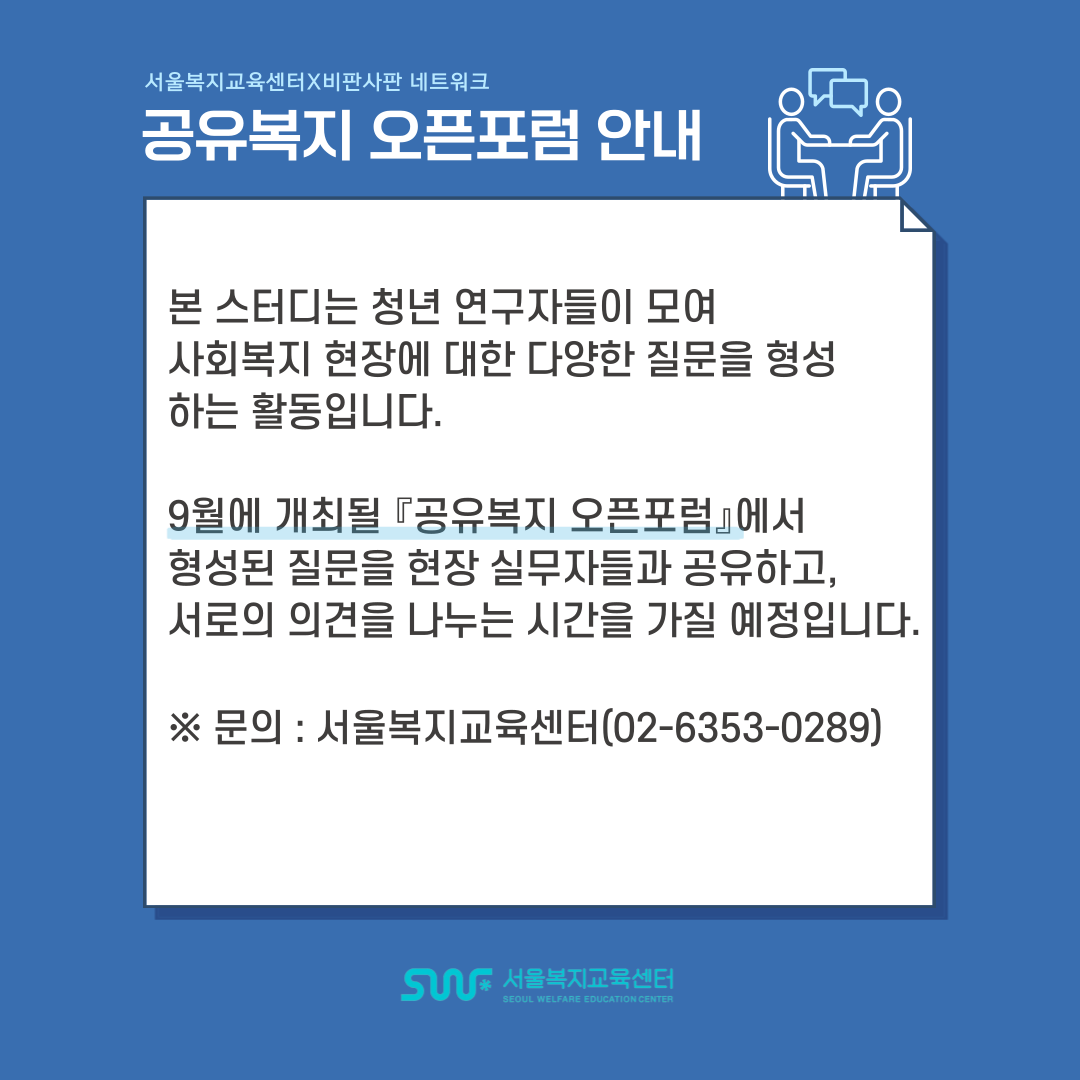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4팀 – 청년과 통합돌봄(탈가정 청년)
· 참여/소속: 김예닮(연세대), 김재희(연세대), 김찬울(연세대)
· 회차/주제: 제2회 – 탈가정 청년과 돌봄의 필요성
· 일시/장소: 2025년 7월 8일(화) 17:00-19:00 투썸플레이스(영등포의사당점)
탈가정 청년과 돌봄의 필요성
탈가정 청년은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가? 이번 스터디 모임에서는 탈가정 청년과 돌봄의 필요성을 주제로 탈가정 청년이 어떠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돌봄(care)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과정이다(Tronto, 1993; Noddings, 1984). 그러나 돌봄의 개념은 단순한 행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족·제도·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실천된다. 전통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은 법과 정책을 통해 돌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으나, 청년, 특히 탈가정 청년은 제도적 돌봄 체계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은 돌봄의 정의와 기준을 학문적·실천적·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탈가정 청년에게 돌봄이 왜 필요한지, 돌봄의 배제 사례와 해외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돌봄은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Tronto(1993)는 돌봄을 “삶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보며, Noddings(1984)는 이를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규정하였다. Parsons and Bales(1955)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돌봄을 가족 제도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실천적으로, 돌봄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주거, 건강, 정서, 사회적 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의미하며, 상담, 정서적 지지, 주거·고용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을 포함한다. 제도적으로 돌봄은 법과 정책에서 규정된 서비스와 예산, 전달체계를 지칭하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다.
탈가정 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 경제적 착취 등으로 인해 원가정과의 물리적/경제적/경제적 단절을 선언한 청년을 뜻한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20). 탈가정 청년은 원가정의 돌봄 기능을 상실하고 주거 불안, 경제적 빈곤,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된다. 현행 청년정책은 취업, 창업, 주거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돌봄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의 특수한 요구는 반영하지 못한다. 공동체 기반 돌봄 또한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의존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관계적 돌봄과 생활 지원이 동시에 요구된다.
탈가정 청년은 제도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출 청년’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지원을 회피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친척·친구와의 관계 단절로 심리적 고립이 심화된다. 연구들은 이러한 돌봄 부재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김소영(2017)은 가족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준비 없는 독립으로 인해 노숙 상태에 내몰리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천화진 외(2025)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2021)의 조사에서도 탈가정 청년은 정서적 외로움과 고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돌봄의 부재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함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국내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기에 해외에서는 탈가정 청년을 무엇이라고 칭하는지, 어떠한 제도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해외에서는 ‘탈가정 청년’을 ‘Youth Homelessness’, ‘Runaway Youth’, ‘Estranged Youth’ 등으로 정의하며, 부모와의 단절 및 주거 불안정 상태를 주요 특징으로 본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청년에게 조건 없는 주거를 우선 보장하는 캐나다의 Housing First for Youth(HF4Y), 미국의 원스톱(One-stop) 센터, 가족 중재 프로그램,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 안정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후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노숙을 예방한다. 또한 당사자 참여와 피어 멘토링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점이 특징적이다(Blake, 2017; Carr et al., 2015). 이는 한국의 청년 돌봄 정책에도 단순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맞춤형·관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탈가정 청년의 독립은 준비된 자립이 아니라 돌봄 부재 속에서 강제된 생존 전략이다. 외국에서도 탈가정 청년과 같은 대상들을 ‘homeless-집이 없다’가 아닌, ‘unhosed-집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못한 상태’로 칭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Reeb, 2024). 그들이 개인의 부족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집을 소유하기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탈가정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적 선택이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돌봄은 단순한 급여 제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적 경험이다. 국가는 청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고, 주거·정신건강·사회연결망을 포함하는 관계적·제도적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탈가정 청년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삶의 유지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탈가정 청년의 대상 특성 상, 학계 내 연구자료가 많이 없는 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필요하기에, 탈가정 청년을 돕는 사회적기업 282북스에서 제공하는 대상 사례집과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세이를 읽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해당 질적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탐색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김소영. (2017).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9(3), 213–240.
장온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https://doi.org/10.21479/kaft.2017.25.3.497
천화진, 김지민, & 신자현. (2025).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과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 검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Blake, L. (2017). Parents and children who are estranged in adulthood: A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9(4), 521–536. https://doi.org/10.1111/jftr.12216
Carr, K., Holman, A., Abetz, J., Kellas, J., & Vagnoni, E. (2015). Giving voice to the silence of family estrangement: Comparing reasons of estranged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 a nonmatched sampl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5(2), 130–140. https://doi.org/10.1080/15267431.2015.1013107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Free Press.
Reeb, R. N. (2024). Introduction to the themed issue: Community-based research on homelessnes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52(1), 1–10. https://doi.org/10.1080/10852352.2024.2354987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댓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