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김예닮
- 2025-09-02
- 79
- 0
- 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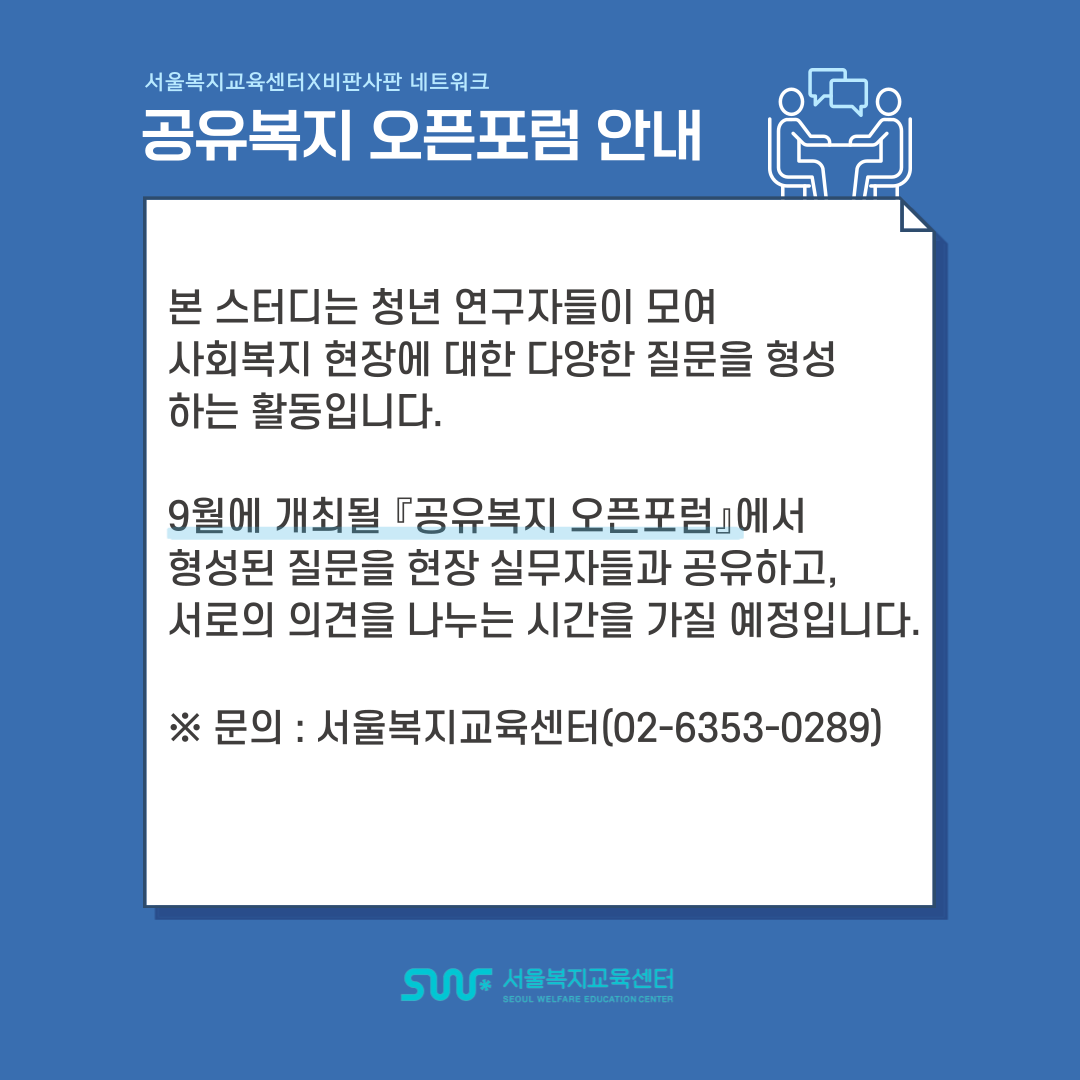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4팀 – 청년과 통합돌봄(탈가정 청년)
· 참여/소속: 김예닮(연세대), 김재희(연세대), 김찬울(연세대)
· 회차/주제: 제4회 – 탈가정 청년 돌봄의 사각지대 : 구속과 해방의 이중성
· 일시/장소: 2025년 8월 28일 (목) 19:00~23:00 / 렛미얼론(신촌점)
탈가정 청년과 돌봄의 사각지대 : 구속과 해방의 이중성
이번 회차에서는 돌봄의 본질적 성격과 탈가정 청년이 직면한 제도적·사회적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은 단순한 시혜적 행위를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로 확장되고 있으나, 가족 기반 돌봄이 붕괴된 탈가정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를 위해 총 다섯 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탈가정 청년 돌봄의 현실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첫째, 돌봄의 이중적 성격과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돌봄은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행위임과 동시에 돌봄 받는 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성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의존' 관계가 암묵적으로 동의되기 때문이다. Joan Tronto의 "삶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정의에서 Nel Noddings의 상호작용적 관계 개념까지, 돌봄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일종의 통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탈가정 청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돌봄이 진정한 자립 지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의존 관계 창출인지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둘째, 돌봄의 학문적·실천적·제도적 정의를 통해 탈가정 청년 돌봄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다니엘 잉스터의 돌봄 윤리에서 제시된 도덕적 의무 개념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 지원을 의미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의 돌봄선언에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내 구조적 무관심에 맞서는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돌봄 개념은, 탈가정 청년 지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돌봄은 상담, 정서적 지지, 주거·고용 지원, 네트워크 연결까지 포괄하지만, 청년 전체를 위한 통합적 돌봄 법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탈가정 청년을 특정하는 제도적 돌봄 범주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셋째, 탈가정 청년이 겪는 복합적 배제 양상과 선행연구와 뉴스기사 등 유사 사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겪는 배제는 제도적 배제(법적 범주 부재, 원가구 소득분위 기준으로 인한 행정적 제약), 사회적 낙인('가출', '문제 청년'으로의 인식), 연결망 붕괴(가족·친척·친구와의 관계 단절)로 구분된다. 김소영(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 노숙 청년의 독립 실패 경험, 천화진 외(2025)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과 자살충동 연구,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2021)의 탈가정 후 정서적 고립 실태, 장온정(2017)의 미혼모 홀로서기 경험 등은 모두 가족 돌봄 부재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강제된 생존 전략'으로서의 독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탈가정 청년의 개념적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패러다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탈가정'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기존의 가정 밖 청소년이나 고립·은둔 청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함의한다. 'coming after + going beyond'으로서의 '탈'은 단순히 가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기존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기대하는(post) 주체적 극복의 능동적 개념이다. 이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청년 독립이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지는 않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기술 독점, 저임금 구조, 원가정 단위 기준 청년지원제도 등은 원가정 지원이 불가능한 탈가정 청년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가족 돌봄 붕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탈가정 청년 돌봄의 실천적 방안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 정서, 경제적 자립, 커뮤니티 형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이다. 단순한 자조 모임을 넘어선 실질적 멘토링 네트워크, 주거 월세 지원과 바우처 형식의 경제 지원, 민간 사업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을 '자원'이 아닌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 전환이다. 돌봄은 단순한 급여 제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적 경험이므로, 탈가정 청년 지원체계 역시 물질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논의는 탈가정 청년 돌봄 문제를 통해 현대 복지국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탐구하였다. 가구 단위 복지 체계의 한계로 인해 청년이 독립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이자 제도적 사각지대이다. 이들의 독립이 '선택'이 아닌 '강제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은 국가가 단순한 지원 제공자를 넘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주체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가정 청년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의 유지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제도적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더불어, 돌봄의 수혜와 시혜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돌봄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던 돌봄을 사회 전체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와 직결된다. 탈가정 청년 돌봄 체계 구축은 단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다음 스터디 모임에서는 탈가정 청년을 실제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282북스’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어서 통합돌봄과 탈가정 청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의 정의를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족돌봄청년과 탈가정청년을 공통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소영. (2017). 남성 노숙 청년의 성인기 독립 이행 실패와 원가족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9(3), 213–240.
은용수. (2017). 상시적 망각과 적극적 기억의 국제정치학. 세계정치, 26, 127-178.
이춘재. (2024). 가족 중심 돌봄이 가족구성원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온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https://doi.org/10.21479/kaft.2017.25.3.497
천화진, 김지민, & 신자현. (2025). 자립준비청년 주거빈곤 유형과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 검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Free Press.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댓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