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관 사회사업 By 김세진
- 2020-08-10
- 665
- 0
- 0
현장
기록의 두 가지 문체
개조식 기록과 서술식 기록
사회사업
현장에서 기록은 크게 개조식 기록과 서술식 기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 방식 모두 필요하나, 주로 개조식 방식으로만 기록하는 듯합니다.
복지관
차량으로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차량 이용 대장에 목적지, 사유, 거리 따위를 적습니다. 여기에 서술식으로 쓰면 이상할 겁니다.
“하늘이
맑은 날, 나들이 사업 선행연구사례 관련 책을 살펴보러 ‘책방, 구슬꿰는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런 날은 파란색 승합차를 가져가는 게 좋겠지요?
날이 맑으니 오가는 길에 나들이 차량이 많아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고
어색합니다. 이런 곳에는 개조식 기록이 적절합니다.
“이용
차량 : 승합차 0000호 | 목적지 : 책방, 구슬꿰는실 | 사유 : 나들이 사업 선행연구 자료 탐색 | 거리 : OO km … ”
이처럼
업무에 따라 어울리는 문체가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을 돕는 사회사업가의 업무일지는 서술식으로 씁니다.
길동 씨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지관 사회사업가와 만났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셨냐는 사회사업가의 물음에 입을 달싹였으니 끝내 아무 말씀도 못하고 이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 모습을
“식사 여부 질문. CT는 답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마음이나
그 상황 따위를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담일지나 과정기록은 서술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나치게
축약하거나, 전문용어를 남발하여 쓰면 기록으로써 가치가 사라집니다.
당사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적절하게 남기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 글을
읽는 동료와 선·후배도 보태줄 말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공감이 따르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삭막한 기계적 기록으로 사회사업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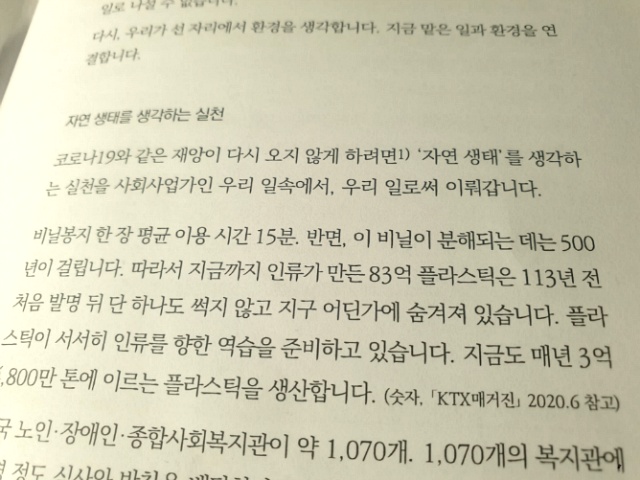
사회사업가와 나누는 글은 주로 이야기체로 씁니다. 독자를 상상하며 씁니다.
급여체와 이야기체
이런 글쓰기 습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의심이 가는 것은 ‘평가’입니다.
외부 평가
방식이 대체로 지원한 예산을 잘 썼는지 살피니
이를 보여주는 ‘건·명’을 남기는
방식으로만 기록했을 겁니다.
사회사업가답게, 복지관답게 했는지 살피지 않으니
이를 증명하는 ‘의도와
근거와 성찰’을 남기는 기록을 멀리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당사자를
위한 일이지만 우리는 전문가이기에 우리의 전문적 판단을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절한 글을 멀리하고 우리끼리 알아듣는 전문용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전문가처럼
짧게, 몇 가지 전문용어로 상황을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글 버릇, 그런 말투를 ‘급식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월급 받고 평가 주체나 윗사람의 입맛대로 쓰는 글은 ‘급여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했음.’과 같은 급여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고서 속 ‘~함’, ‘~음’, ‘~임’…대체 왜 쓰는 걸까?
‘-함’, ‘-음’의 개조식 보고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장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보고서에서 ‘-함’이나 ‘-음’ 또는 ‘-임’으로 문장을 끝맺음하는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로 문장을
끝맺는 일반적인 ‘서술식’ 문장이 아니라 이른바 ‘개조식’ 문장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회의록을 비롯해 각종 서류 문서에
시종여일
관통하는 이러한 개조식 문장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함', '-음', '-임'으로 문장을 끝맺는 이러한 문장 방식은 일제 잔재다.
즉, 구한말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이다.
물론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에 반한다. 일본 메이지(明治) 시대에 '대일본제국 헌법'을 비롯하여
"권위가 요구되는" 법령의 문장이나 교과서 등에서 이른바 '문어(文語)'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문어' 문장들은 이를테면,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함(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 등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통해 일본이 의도한 바는 바로
문장 자체에 '권위(權威)'와 위엄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방식은 우리의 관료사회와 기업문화를
권위주의적으로 관철시켜왔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이러한 개조식 문체(文體)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장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들의 심리와 그리하여 삶 전체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다.
언어란
개념을 담는 그릇으로서 언어생활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천황의 덕을 흠모하여 귀속하다"는 의미를 지닌 ‘귀화’라는 용어부터라도
하루바삐 고쳐지기 바란다.
‘[기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소준섭 국제관계학박사, 프레시안, 2019.2.20.
이 글이 특정 학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며 일상에 녹아들었고, 써보니 편리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글을 읽는 독자를 생각하면 조심스럽습니다.
나를 돕겠다는
사회사업가의 기록이 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말투로 남긴다면 서운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이해하고
공감해주길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꿉니다.








댓글
댓글
댓글 0개